말 그대로, 나선 김에 두루 둘러보고 왔던 베트남 출장이었다. 짜여진 일정 때문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호찌민으로 들어가서 하노이로 나오는 경로가 귀국 시에는 조금 편하다. 비행 시간이 짧아 피로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첫 목적지인 호찌민으로 가는 길이 조금 길어졌으나, 호찌민에서 하노이, 그리고 인천으로 오는 길은 매끄러웠다. 귀국편의 운항 지연도 한 시간을 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다.
이번에 박닌을 처음 방문했다. 제조업 관련 엑스포에 참가하는 하루 일정이었는데,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도심에서 한 시간 남짓 만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지척지간이다.
그랩과 그 대안들…
베트남을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용하게 되는 ‘그랩’은 이번에도 열일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도 하나 알게 됐다. 이용 요금이 아침과 오후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 싶었지만 두 배를 넘을 줄은 몰랐다. 하노이에서 박닌까지 생각보다 막힘 없이 질주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랩의 대안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그랩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유사한 경험을 했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그랩은 오랫동안 매우 ‘고마운 존재’로 기억된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나 바가지 택시 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면 그랩은 단연 ‘원톱’ 솔루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그랩’의 가치가 자꾸 퇴색하는 듯한데,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이제 그랩의 대안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랩 대안’ 혹은 ‘그랩 대체’은 여행 전 필수 검색어가 된다.
지난 다낭 방문에서 꼭 그랬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인드라이브’는 동일 거리를 이동할 때 그랩 요금의 절반이면 충분했다. 이는 이동 거리가 길수록 더 진가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호이안에서 다낭, 다낭에서 호이안으로의 이동은 단연 ‘그랩보다 인드라이브’가 답이다.
하노이에서도 그랩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번 방문에서 얻은 작은 성과(?)다. 결국 전기자동차로 차별화하고 있는 싼SM(Xanh SM) 앱을 설치했고, 그랩과 번갈아 이용했다. 이들 두 앱은 용호상박처럼, 상황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는 필수다. 인드라이브가 그랩을 압도하는 다낭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노이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행사장에서 시내로 이동하려고 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도 호출이 되지 않던 그랩 대신, 싼SM을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이용했을 때 느낀 감정은 역시 ‘독점보다 경쟁’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였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에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에 ‘락인(lock-in)’되었다가는 부지불식간에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한다.
고객 로열티가 합당하게 보상받는 일은 ‘없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물류와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 정말 우연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차이는 두 배를 넘어 세 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사’하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닐 듯해서, 이용 중인 사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내심 1.5배 정도 수준의 비용이라면 그냥 이용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그냥 그곳으로 가라’였다.
번거롭기는 했지만, 결국 이전을 택했고, 그 후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달라진 것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물류와 유통 비용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성과’다.
사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가장 쉬운 예는 집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이고, 늘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대체로 ‘충성스런 고객’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한다. ‘떠나겠다’고 할 때, 더 좋은 선택지가 등장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상’이 따라온다.
얼마 전 어도비 소프트웨어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 이 역시 이용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올라서, 그대로라면 다른 선택지로 옮겨갈 생각이었다.(물론, 다른 선택지를 찾는 일은 막막하다.) 하지만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갱신할 수 있었다.
베트남 산단은 안녕한가
베트남 산업단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장황하게 늘어놨다.
베트남에서 산업단지를 이전하는 일은 처음부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감히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들 한다.
정말 한국 기업들에게 ‘두 번째 선택을 할 권리’는 없는 것일까? ‘고인물 산단’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간단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도전할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여러 상황(예를 들어 정부 정책, 인센티브, 기후 문제를 포함한 ESG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산단 이전’ 또는 ‘산단 재배치’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실제 실행에 옮기는 일이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기존 산단과의 크고 작은 협상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친김에 ‘베트남 산단 재배치’를 주제로 한 가이드북을 낼 생각이다. 베트남에서 ‘산단 로열티’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꿈틀’하면 더 나은 혜택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들이 하나둘 생겨나면 좋겠다.
이성주
Foundi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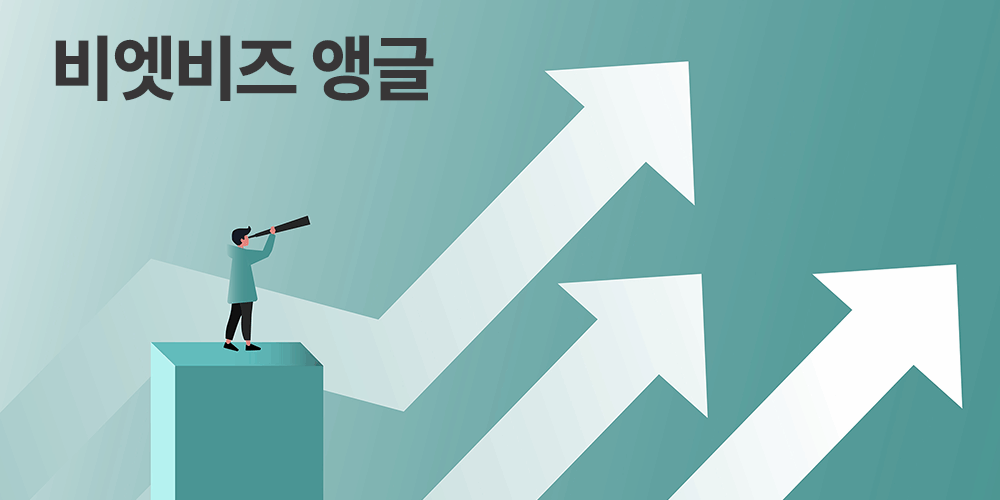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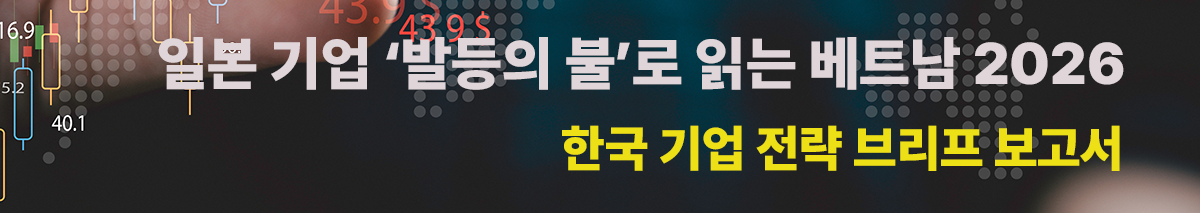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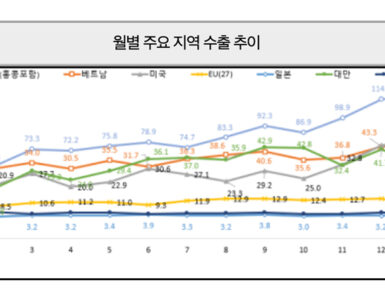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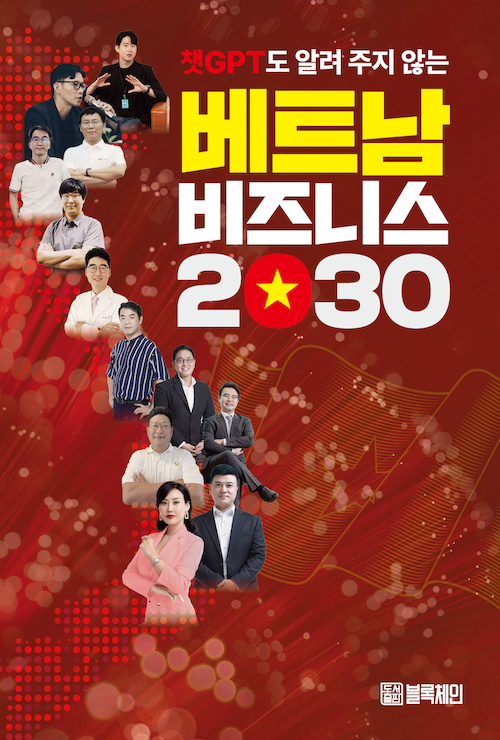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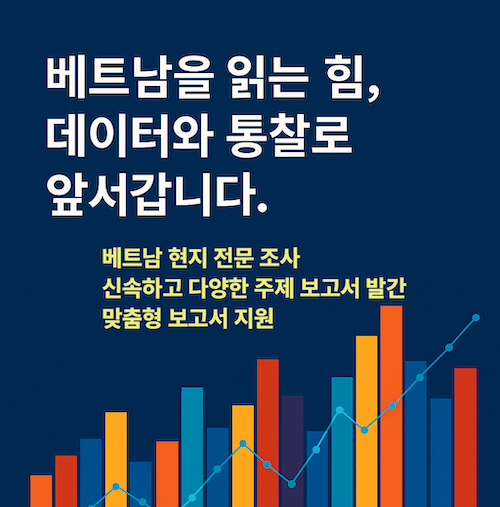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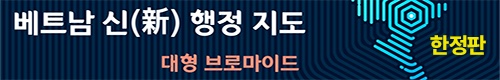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