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베트남 내 행보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봉합되더라도 깔끔하지 않게 됐다. 설령 롯데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당장의 손해를 크게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름 아닌, 한때 한국과 베트남 경제 협력과 도시 혁신의 상징이라고까지 불린 호찌민시 투티엠 에코 스마트 시티(Thu Thiem Eco Smart City) 프로젝트와 관련한 롯데의 ‘좌충우돌’ 행보 이야기다.
롯데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호찌민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베트남 매체를 통해 확인됐다. 10월 1일자 베트남뉴스(Viet Nam News)에 따르면, 롯데는 아직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투자자로 남아 있다. 베트남 투자법에서 요구하는 공식 철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롯데 현지 법인(Lotte Properties HCMC)이 공식 철회를 요청한 시점이 8월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당시 롯데의 결정은 호찌민시가 토지 사용료를 대폭 상향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베트남의 손실 vs. 롯데의 손실
롯데의 ‘사업 철회’ 결정은 한-베트남 간 신뢰 문제로 번졌고, 더 나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베트남 투자 환경 자체를 의심하는 수준으로 증폭됐다. 베트남 정부의 신뢰 훼손은 ▲행정 지연 ▲토지 사용료 급등 ▲법적 불확실성 노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번 사태로 베트남은 ‘약속을 뒤집는 국가’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롯데가 자신이 입은 손실을 지렛대로 삼아 베트남 정부에 압박하려 했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호찌민시의 대형 부동산·인프라 투자는 불확실성 관련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롯데마저 못 버틴다’는 신호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인 싱가포르·일본·홍콩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커지면서, 베트남 정부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 역시 ‘베트남 내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간접 학습을 통해, 대규모가 부동산·인프라·유통·금융 분야에서 심리적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롯데는 꺼져가던 ‘호찌민시 스마트 시티’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 지금은 ‘철수’와 ‘잔류’의 이분법보다는 ‘재구성’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시나리오는 ▲토지 사용료 집행 조건과 인가 패키지의 재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다운사이징 또는 단계적 착수다. 반면 롯데의 ‘판 흔들기’가 무위로 끝나면, 롯데가 밝힌 대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컨소시엄에 넘기는 수순이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롯데 사태가 한국 기업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많다.
첫째, 베트남 사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는 외부 변수로 인해 손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복합개발은 인허가·토지·금융·시공이 얽혀 지연 리스크는 상수에 가깝다. 단일 책임 주체를 두고 리스크 관리·규제 대응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롯데의 사업 철회 통보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협박 카드’처럼 비칠 소지가 있었다. 원인이 정부와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 과정에서조차 투명한 소통과 절차를 밟아 ‘책임 있는 투자자’라는 인상을 주었어야 했다.
넷째, 출구 전략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롯데는 출구 시점과 메시지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장사꾼’ 이미지가 부각돼 회복하기 어려운 패착을 남겼다. 한국 기업들은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철수할 것인가’를 미리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롯데의 이번 행보는 한국 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작지 않다. 베트남은 특정 기업의 실패를 ‘한국 기업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롯데 사태는 베트남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베트남 내 투자 환경의 의구심을 키웠다. 동시에 롯데가 그룹 전체의 신뢰 관리 역량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이성주
Foundi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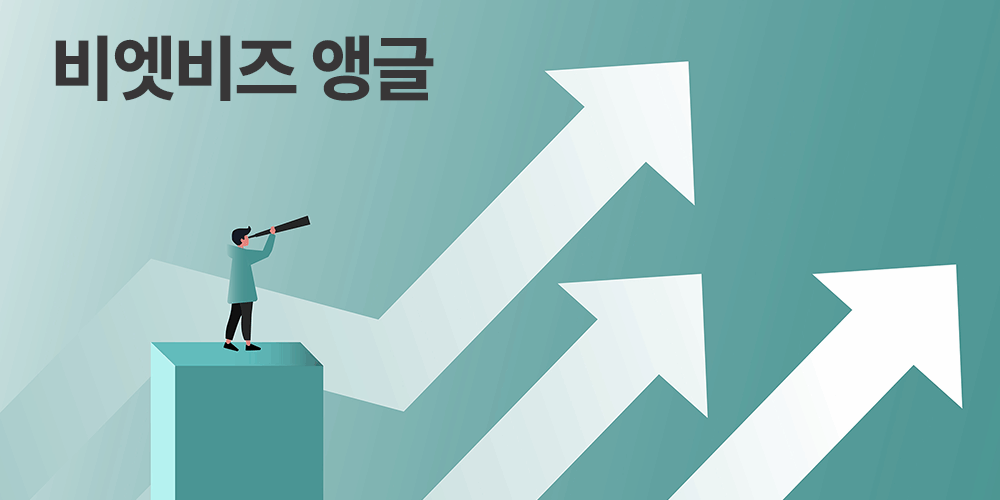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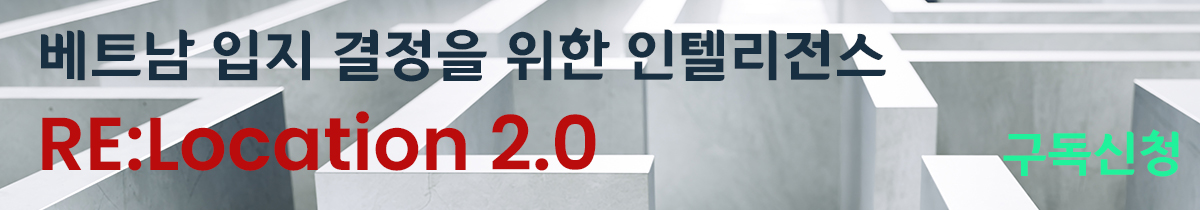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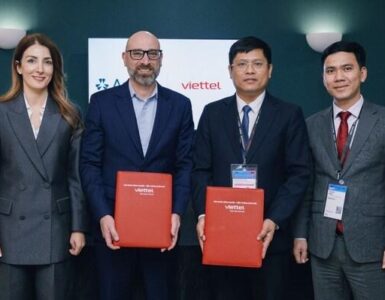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