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이를 견인했다.
모바일용 반도체 수출액은 22.4억 달러(약 3조1915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이상 늘었다. 베트남 수출 전체 규모인 59.3억 달러(약 8조4490억 원)의 3분의 1을 넘었고, 정보통신산업 부문 수출(40.6억 달러, 약 5조7846억 원)에서의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미국·중국 간 반도체 무역 긴장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에서 중국 비중이 줄고 베트남 비중이 커진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베트남 내 전자기기 조립·제조 확대가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베트남에도 후공정(OSAT)과 테스트·패키징 시설이 존재하며, 반도체 조립과 후공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품·칩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내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부터 인공지능 응용, 스마트 공장, 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베트남 제조업과 전자제품 생산의 고도화가 반도체 부품·모듈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강화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즉 ‘쌍둥이 전환’을 추진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휘·조정 기구를 재정비해 부총리(기획투자부 장관 겸직)를 위원장으로 격상됐다. 반도체 관련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공급망 내재화, 표준화, 보안 등 아젠다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만큼 베트남이 단기간에 선도적 위치에 오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는 결단을 내렸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수입관세 면제, 토지 임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중심 생산에서 벗어나 ‘제3의 생산 거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베트남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 본질적인
베트남이 반도체 산업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베트남이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양국 간 협력은 이론적으로 유망하지만, 실제로 실행에는 여러 걸림돌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외부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반도체를 ‘무기화’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자극했고, 대만과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협력의 최대 걸림돌은 ‘기술과 인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인프라·제도’ 측면의 미비로 섣불리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완화기 위해서는 점진적 이전, 인프라 공유, 제도 조율, 리스크 분담 설계, 책임 구분 명확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다.
첫째, 기술 이전 문제다. 베트남 정부나 현지 파트너는 ‘기술 공유’나 ‘공동 연구’를 강조하며 사실상 ‘기술 이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협력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수출통제 규정상 기술을 임의로 공유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현지 협력은 대개 ‘인재 양성’이나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무르고, 핵심 공정·지적재산 등은 ‘블랙박스’ 남는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기술 이전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한국은 ‘기술 유출 리스크’로 경계하게 되어 협력이 ‘표면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베트남의 행정 리스크다. 반도체는 토지·환경·수자원·전력·통관 등 여러 부처가 얽히는 사업인데, 베트남은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이 약하고 지역별 해석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행정 절차에 ‘비공식 비용’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공식 행정 절차’에 부딪히면 프로젝트는 지연되기 쉽다.
셋째, 특정 기업 의존 문제다. 예를 들어, 메모리는 삼성, 후공정은 앰코(Amkor)에 의존하는 식이다. 이 경우 공급망 확장이나 기술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보일 수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전체 가치사슬 이전이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만들려면 정책의 ‘속도’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자본보다 운영 모델로, 베트남은 선언보다 제도적 신뢰성으로 답해야 한다.
다만 최근 베트남 정부가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이성주
Foundi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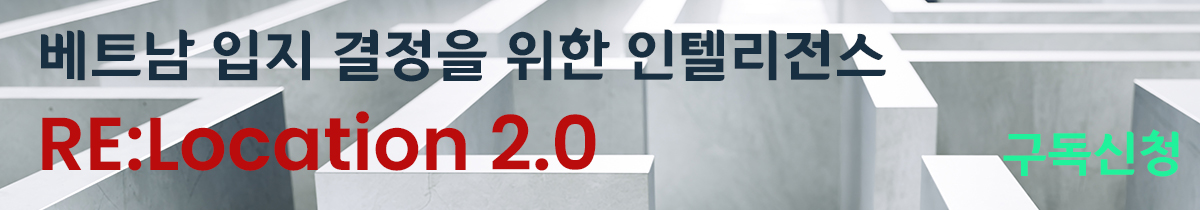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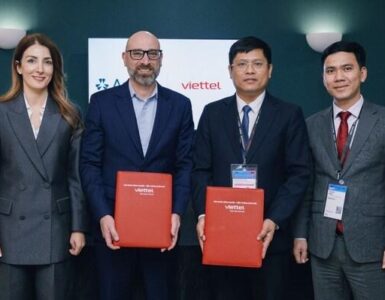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