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주요 언론들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강제 노역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과는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은 일본에 과거사를 사과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 역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식민 지배의 침략자로서 잘못을 끝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다. 따라서 한국의 요구는 정당하며, 일본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역사적 사과 요구를 별도로 강조한 것은 타당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일본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외교 균형을 되찾은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이중 잣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에 끊임없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적 대가와 정치적 이익을 얻었으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을 주민 135명(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하미 학살(1968년 꽝남성) ▲약 400명의 마을 주민을 집단 살해한 빈호아 학살(1966년 빈딘성)은 지금도 현지 주민과 유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전쟁 중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민간인을 향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전쟁 당시의 역사적 만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지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치유될 때까지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피해 경험이 있는 한국이야말로 전쟁 피해국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과 노력이 있을 때, 한국의 대일 사과 요구는 더욱 도덕적 무게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일본에는 끝없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베트남에는 침묵한다면 이는 이중 잣대에 불과하다.
한국이 베트남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노력은 베트남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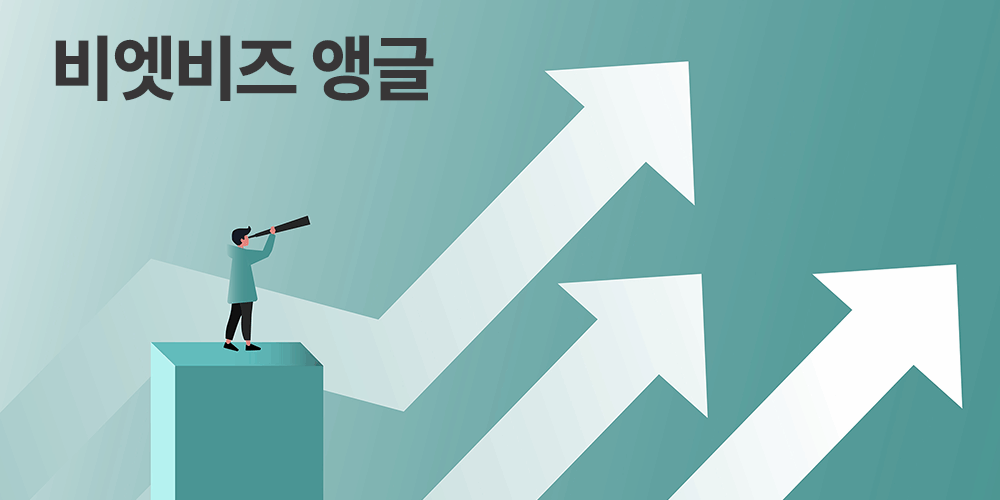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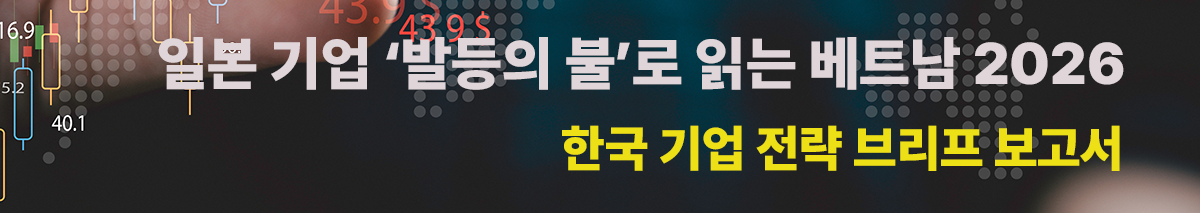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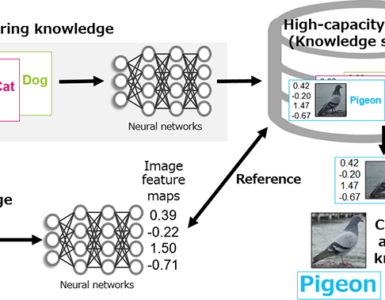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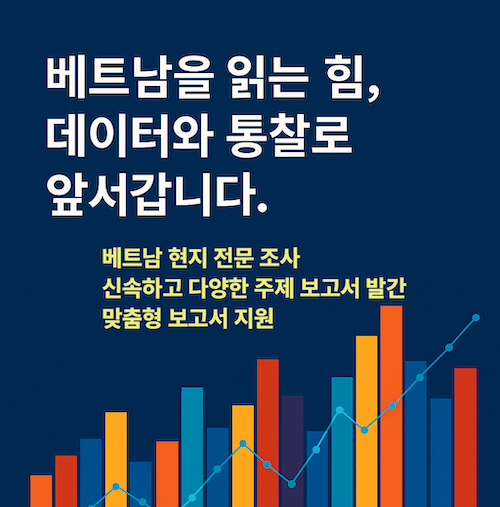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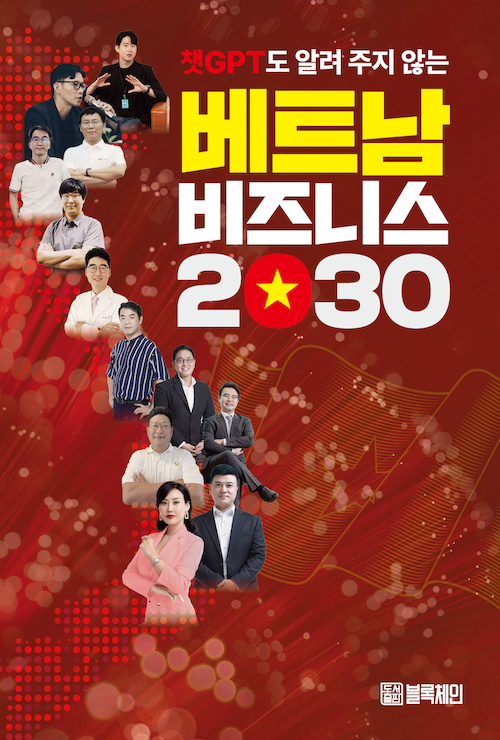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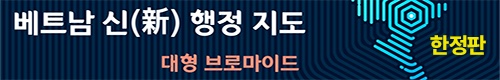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