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일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린다. 현지 전문가의 전언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지역의 단면이 전체 분위기로 과대 해석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것은 2025년 11월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제목과 달리 한계가 분명하다. 코참 하노이(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원사 343개(제조업 28%, 서비스업 42%)를 중심으로 작성돼 표본이 북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즉,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전체’라기보다 ‘베트남 북부권 한국 기업’의 심리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코참 호찌민(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에 속한 2,200여 개 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철수 고민 늘어난 한국
보고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베트남 내 생산비용 상승과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철수·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사 기간이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글로벌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사업 전망에서 철수나 이전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20.7%로, 2024년(10.5%)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현상을 유지한다는 응답은 31.8%로 2024년(42.4%)보다 감소했다.
활기찬 중국과 유럽 기업들
거시 지표만 보면 베트남 경제는 ‘활기’차다. 베트남은 2025년 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관세’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넘어서 거둔 성과다.
그래서인지 유럽 기업들의 비즈니스 심리는 매우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업신뢰지수(BCI)’는 전 분기 대비 13.5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급등하며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 기업들은 베트남의 중기 전망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응답자의 다수(88%)는 2026~2030년 베트남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응답자의 87%는 베트남을 다른 외국 기업에 투자처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 현장의 ‘움직임’에서 빠른 신호가 잡히는 곳이 산업단지다. 요즘 주요 산단들 사이에선 중국계 수요를 잡기 위한 인력 보강, 조직 재배치, 마케팅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고객은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이 빠르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반대로 일부 산단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 대상 마케팅이 약화되는 듯한 인상이다. ‘오는 기업은 막지 않지만 공격적 마케팅은 자제한다’는 식의 태도 변화다. 특히 임대공장(RBF)이나 물류창고(RBW)는 지역에 따라 수급 구도가 바뀌면서 ‘굳이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번진다. 수요를 ‘찾아오는’ 고객으로 채우는 장세라면, 느리게 움직이는 고객보다 빠른 고객을 우선순위에 둘 유인이 커진다.
변화하는 베트남 비즈니스에 동화되어야
같은 베트남 땅에서 다른 분위기가 퍼져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기대치의 차이일 수 있다.
베트남의 가치를 여전히 ‘낮은 인건비·저비용 생산기지’로만 정의하는 기업에겐, 인건비 상승은 곧바로 이전이나 철수를 고려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인력 이탈을 막는 문제가 급하면, 혁신·고도화·현지화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린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와 산업 구조는 이미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 ‘낮은 인건비, 저비용 구조’만을 전제로 베트남을 바라본다면, ‘헤어질 운명’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다.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동반 성장의 시장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던져야 한다.
이성주
Foundi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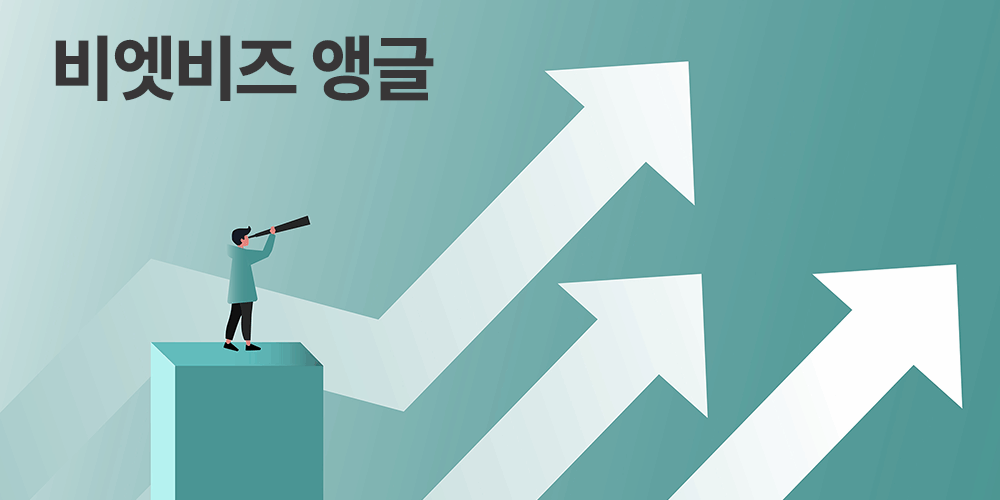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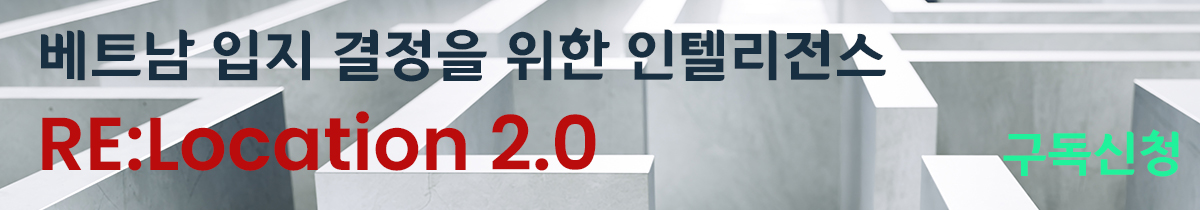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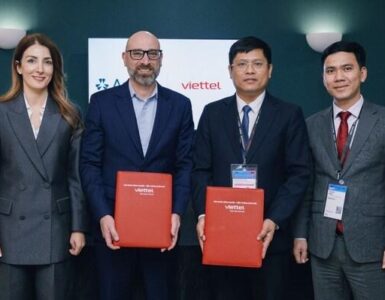







댓글 작성